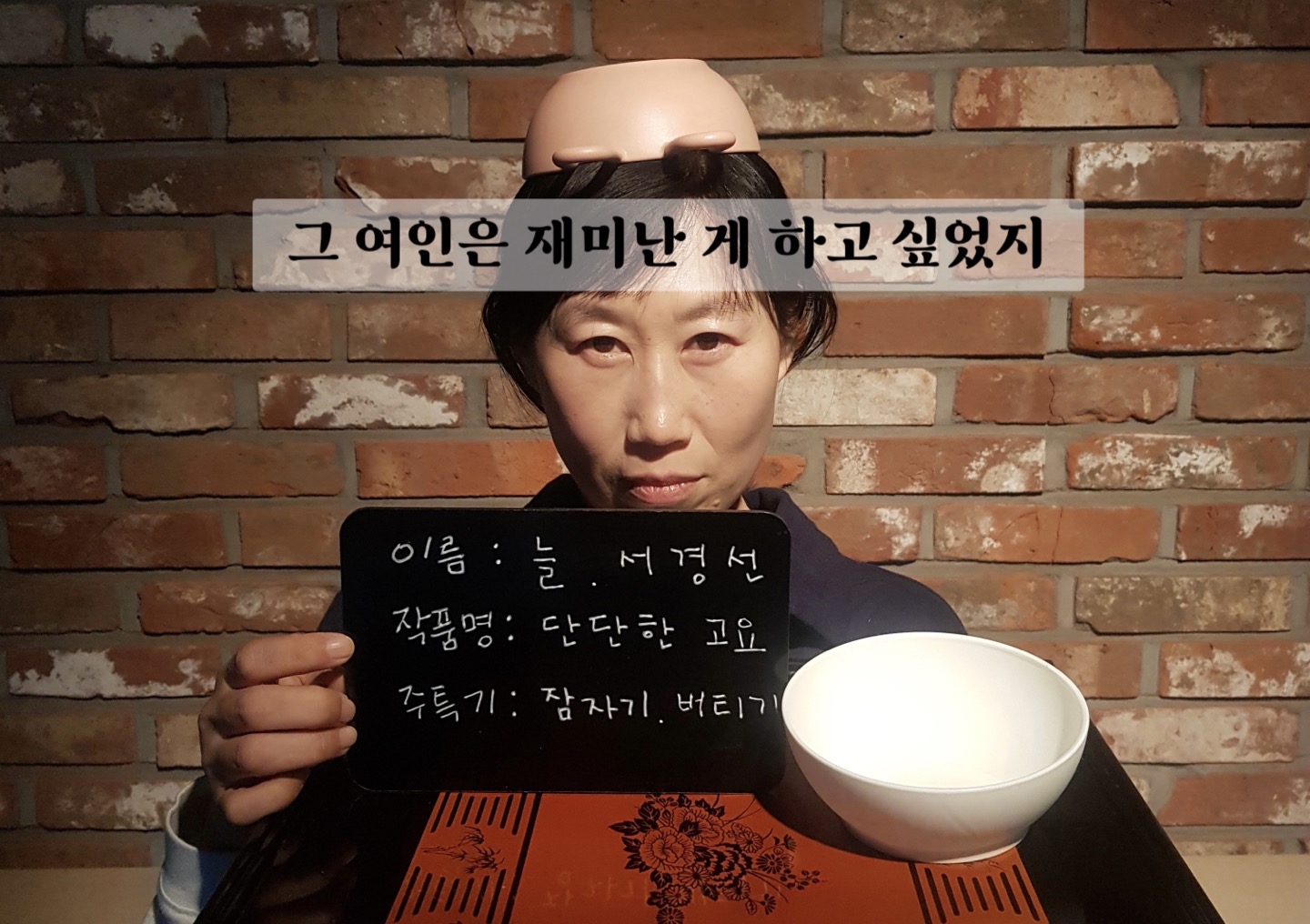'긍정성의 폭력은 박탈하기보다 포화시키며 ,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갈시키는 것이다.'
피로사회 중 p.21
21세기, 3차 산업혁명을 지나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며
시대는 급변하기 시작했고 유독 빠르게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
21세기는 신경성 질환의 시대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다.
우울증,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소진 증후군 등
현대사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신경성 질환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은 세계에 대한 반응이며, 이는 우리가 세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실제로 아픈 것은 세계를 앓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저자는 현대의 과한 긍정에너지, 이는 곧 성과사회의 burn-out신드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무한정한 할 수 있음은 되려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21세기의 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모했으며
이 사회의 주인도 더 이상 보종적 주체가 아니라 성과주체라고 불린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인 것이다.
주도적으로 오직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와
성과를 향한 압박 속에서 대서는 무엇을 표현하는지,
탈진한 자아를 예술로 승화시켜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는지.
다 타서 꺼져버린 탈진한 영혼이 움직임 속에 드러나고 있는지.
과도한 긍정의 사회, 이 성과주의 사회에서
무용예술인으로서 산다는 것에 대해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긍정성의 과잉 상태에 아무 대첵도 없이 무력하게 내던져져 있는
새로운 인간형은 그 어떤 주권도 지니지 못한다.
우울한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로서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물론 타자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그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강조적 의미의 자아 개념은 여전히 면역학적 범주다.
그러나 우울증은 모든 면역학적도식 바깥에 있다.
우울증은 성과주체가 더 이상 할 수 있을 수 없을 때 발발한다.
아무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더 이상 할 수 있을 수 없다는 의식은 파괴적 자책과 자학으로 이어진다.
성과주체는 자기 자신과 전쟁 상태에 있다.
p.27~28
<책의 내용에 더하여 ..>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 맴도는 긍정의 메시지들이 많다.
도저히 올라 올 수 없는 좌절의 상태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을 외치며 끊임없이 긍정하라고 외친다.
그 과도한 긍정의 메시지 안에서 오히려 급격한 우울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나 자신과의 전쟁상태에 있다는
저자의 말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와 닿았던 내용이었다.
프로젝트는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정해진 프로세스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신경질적이 되어가고 자책하며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며 살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이토록 피곤한 사회에서 오롯이 나라는 존재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싶었다.
-조율, 오후의 예술공방 멤버
'감성스터디살롱 오후의 예술공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0th 살롱스터디 알림: 고전 낭독회 '햄릿' (18.1.27.토) (0) | 2018.02.20 |
|---|---|
| 39th 살롱스터디 알림: 4차 산업혁명 (17.11.25) (0) | 2017.11.21 |
| 38th 살롱스터디 후기: <부드러운 몸의 길을 찾아> (17.7.29) (0) | 2017.08.24 |
| 38th 살롱스터디 알림: <피로사회> by 한병철 (17.8.26) (0) | 2017.08.23 |
| 37th 살롱스터디 알림: <부드러운 몸의 길을 찾아> 17.7.29. (0) | 2017.07.25 |